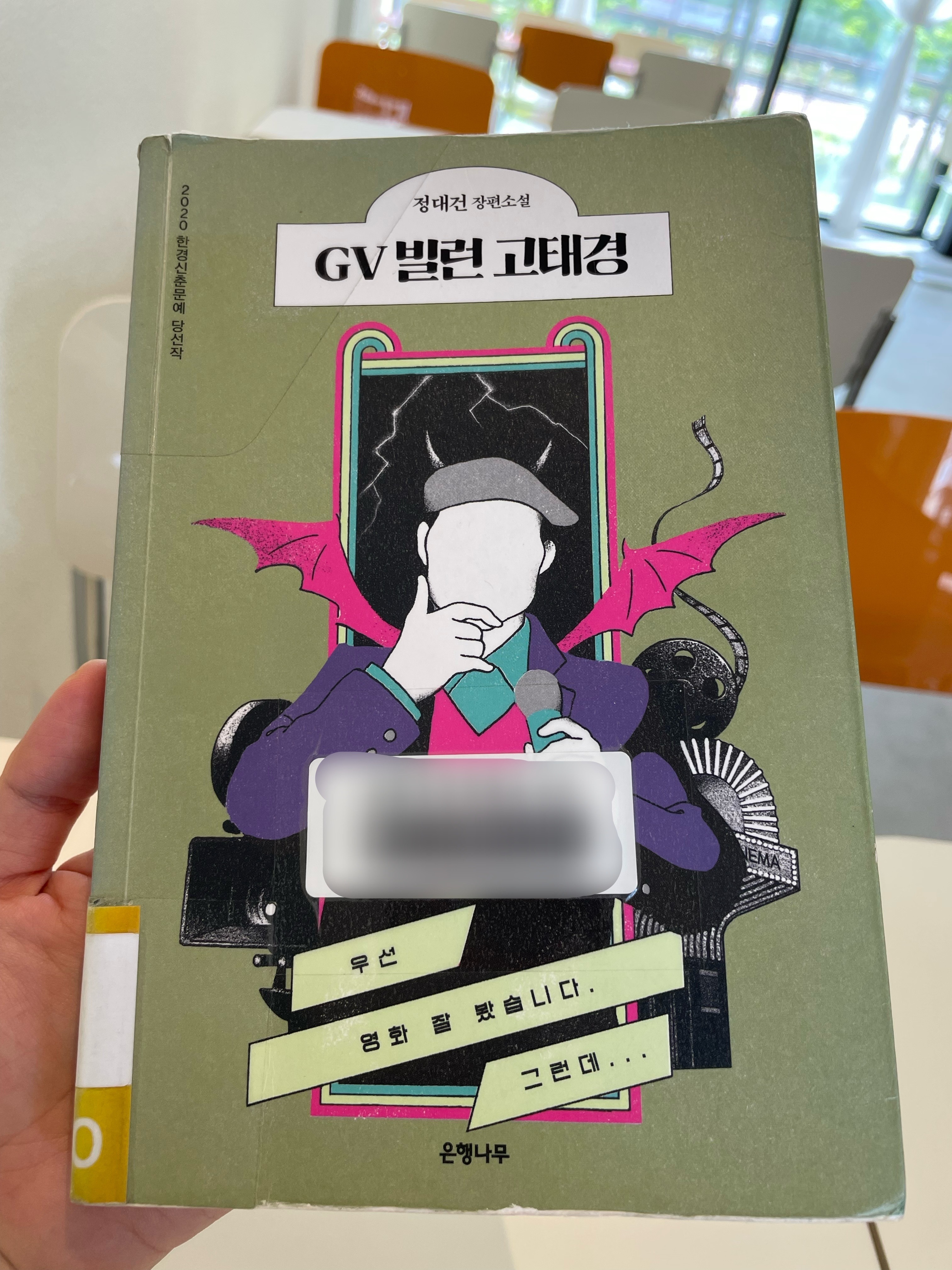
소설 중반부를 넘어서며 이야기에 더 빠져들었다.
어느 문장에서 나는 조혜나 감독이었다가
또 고태경이 되었다. 그리고 결국 울고 말았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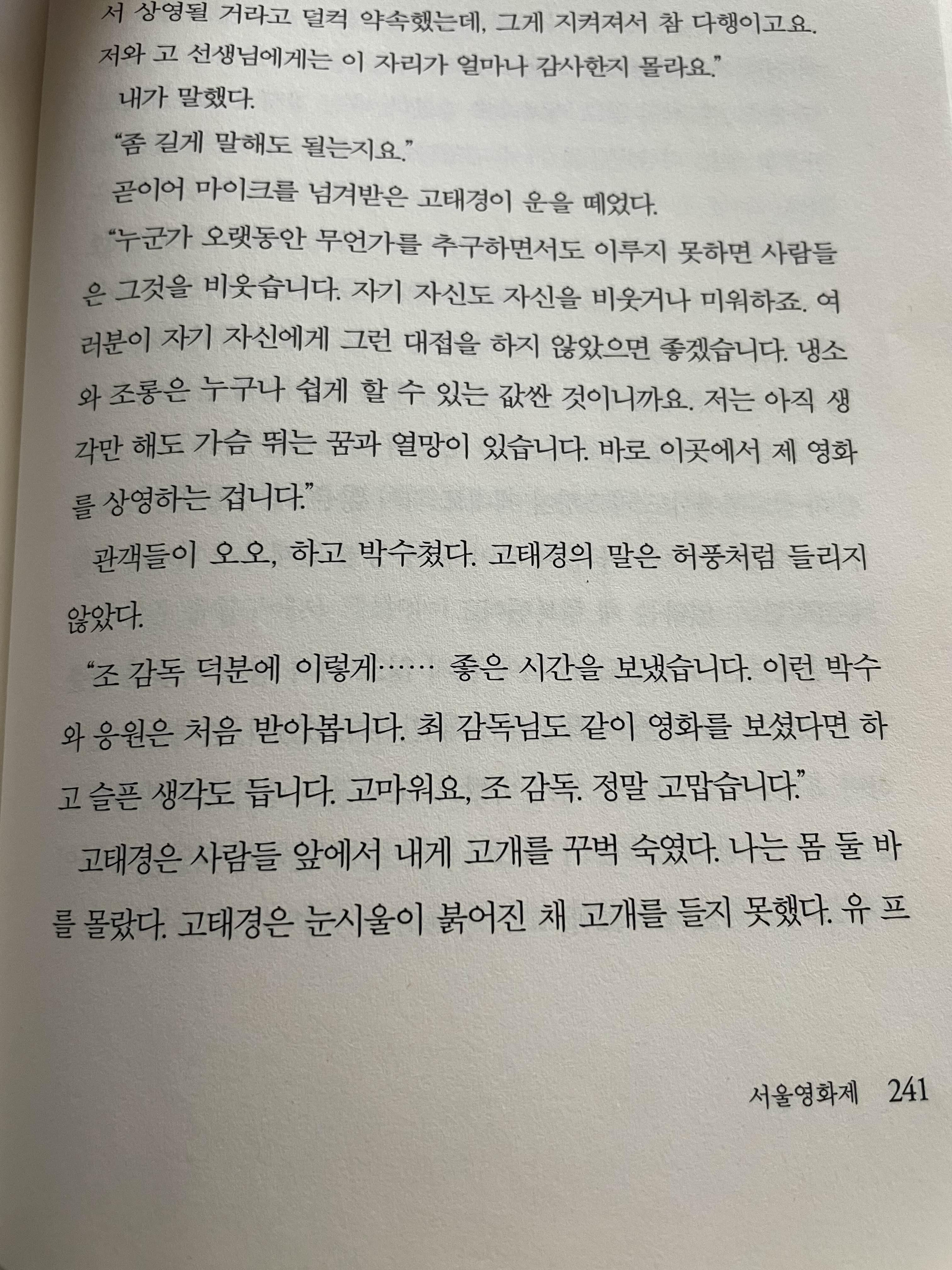
알고 지낸지는 오래 됐지만 서로 잘 모르는 이들과 정기모임을 했던 적이 있다. 어쩌다 내 꿈이 작가라고 밝히고 언젠가는 내 글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고 얘기했다.
근데 저 친구 글 읽어본 적 있어?
아이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
남아있던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.
거기 있던 지인 하나가 내가 글 활동한 지난 날을
나대신 변호하듯 얘기해줬다.
“아니, 난 SNS에서도 못 읽어본 것 같은데
작가가 꿈이라고 해서.
보통 작가가 꿈인 사람들은 글 많이 올리지 않나?”
사실이었다.
무슨 악의가 있거나 비꼬려고 한 질문이 아니라
단지 정말 궁금해서 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.
그런데 마음이 상했다.
가까이 있었는데 직접 묻지 않고 내 친구에게
물으신 의도가 있는 걸까 싶었다.
결국 나서서 내가 직접 대답하지 못하고
계속 같은 장소에 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
못 들은 척 흘러보냈다.
몇 년이 지나서도 그 장면이 문득 떠올랐고
아직도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.
“누군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. 자기 자신도 자신을 비웃거나 미워하죠.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냉소와 조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값싼 것이니까요. ” (p.241)
계속 글을 쓰면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기에
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던 나.
그리고 그 근거가 되어 준 몇 년 전 지인의 한 마디.
책을 읽다 마주한 나의 깊은 부끄러움과 마주했다.
그리고 아직 자신에겐 꿈이 있다 당당하게 밝히는
주인공의 외침에 왈칵 눈물이 났다.
내게도 아직
생각만해도 가슴 뛰는
꿈과 열망이 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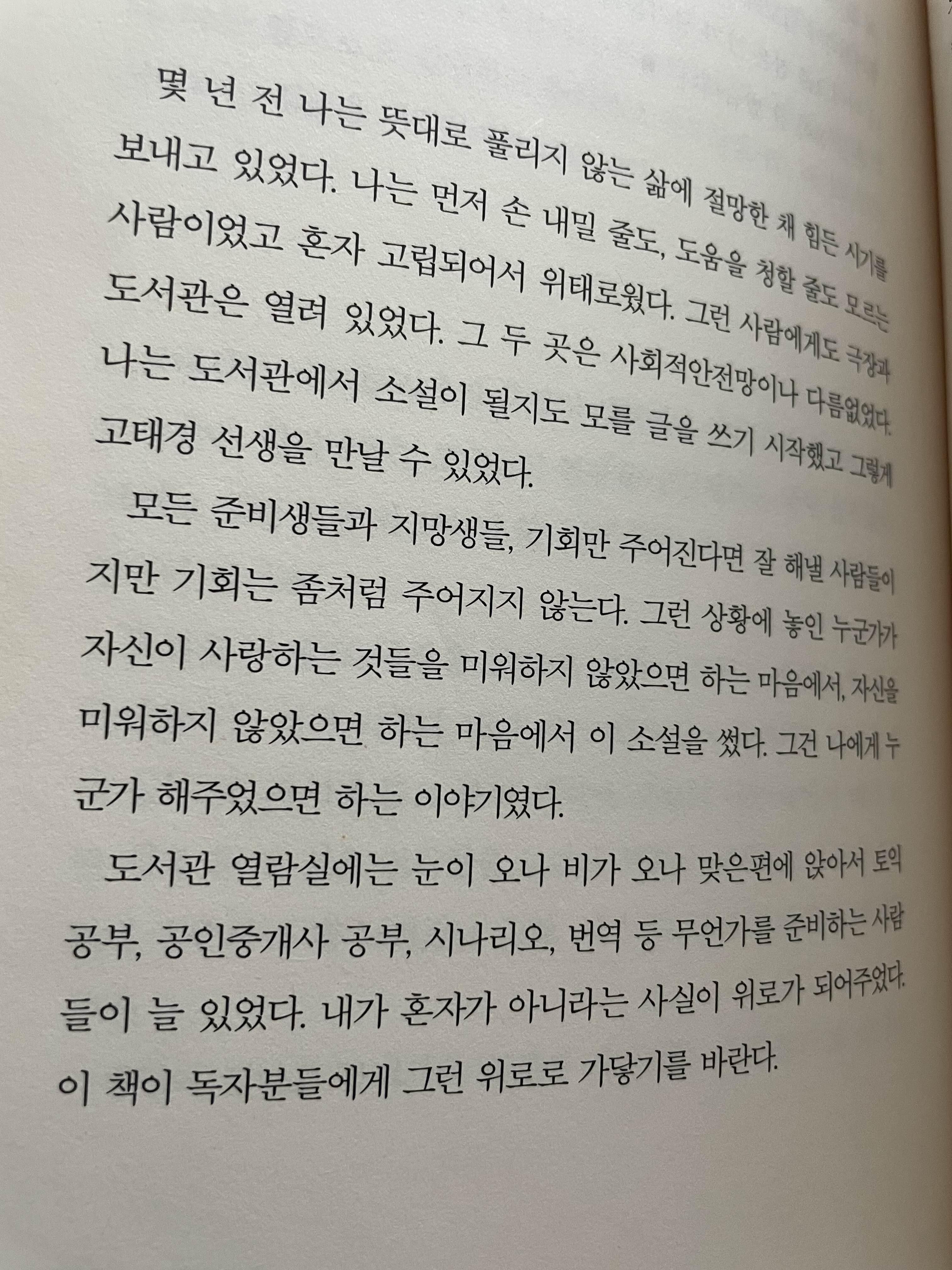
정대건 작가님 감사합니다!
이 책이 제게 위로로 와닿았어요!!
